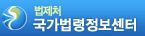사기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2521 결정 /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6. 선고 2017노3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12. 23.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주소보정과 함께 소재탐지 등을 거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7. 9. 15.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검사는 2017. 9. 19. 위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자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와 함께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4. 9.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는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1심판결의 요지, 죄명과 선고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8. 4. 27. 원심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5)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관해서만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4. 9. 송달받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원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도 소멸되었는데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2018. 4. 27. 제출한 항소이유서 역시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소권회복청구,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시정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므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심판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