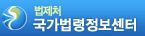실용신안법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유죄 이외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공1991, 120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20. 선고 2002노17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들이 늦어도 위사감지기(緯絲感知器)에 대한 실용신안권 등록을 마친 1999. 3. 31.에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이 훨씬 지난 2000. 1. 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월이 되는 1999. 7. 7.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위 고소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 친고죄인 포괄일죄의 고소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고소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월이 되는 시점보다 전에 행하여진 범행에 관하여는 위 고소가 무효라고 설시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으로서는 원심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사감지기의 제작행위자로, 공소외인을 위사감지기의 구입 및 판매행위자로 특정하여 이들이 각각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위사감지기의 정당한 실용신안권자로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비로소 피해자들이 정당한 실용신안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위사감지기의 판매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제작행위에 사전 공모 내지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범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고소한 일시는 2000. 1. 6.인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외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위사감지기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1999. 11. 11.경부터 2000. 5. 초순경까지 위사감지기를 생산하여 공소외인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은 공소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비로소 피해자들이 정당한 실용신안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위사감지기의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앞서의 사실인정과 전혀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